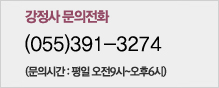신심명(神心銘) 강설 (21-30)
마이템플
0
2411
2008.03.15 11:45
21)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二見에 不住하야
愼莫追尋하라.
(이견) (부주) (신막추심)
(이견) (부주) (신막추심)
두 가지 견해는, 즉 양변의 변견을 말합니다. 이 변견만 버리면 모든 견해도
따라서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변에 머물러 선악ㆍ시비ㆍ증애 등 무엇이든지 변견을 따르면 진여자성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22)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纔有是非하면 紛然失心이니라 .
(재유시비) (분연실심)
갖 시비가 생기면 자기 자성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자기의 진여자성을 구하려고 하지말고 망령된 견해만 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망령된 견해란 곧 양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양변을 대표하는 시비심(是非心), 즉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을 들어 망견이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법이 옳고 세법이 그르다든지, 반대로 세법이 옳고 불법이 그르다든지 하는 시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이 큰 병입니다. 우리가 실제의 진여자성을 바로 깨쳐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이 시비심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견을 쉬고 양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비심을 두 가지 견해를 대표하는 예로 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법(相對法)의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3)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二有一有니 一亦莫守하라
(이유일유) (일역막수)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마저도 버려버리라 하는 것입니다.우리가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알았다 해도 중도가 따로 하나 존재한다고 하여 여기에 집착하면 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때문에 둘이 있으니, 하나 마저도 지키지 말고 버려라, 곧 중도마저도 버리라 하였습니다. 중도는 무슨 물건이 따로 존재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떠나서 융통자재한 경지를 억지로 표현해서 하는 말입니다.
24)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법이 허물없느니라. 一心不省하면 萬法無垢니라
(일심불생) (만법무구)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만법이 원융무애하여,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융통자재를 말한 것으로서
사사무애(事事無碍)ㆍ이사무애(理事無碍)의 무장애법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디서 성립되느냐 하면 바로 양변을 여읜 중도에서
성립됩니다. 즉 시비심의 두 견해를 버리고, 하나마저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일체만법에 통달무애한 무장애법계가 벌어져 일체에 원융자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25)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無垢無法이요 不生不心이라.
(무구무법) (불생불심)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허물도 없고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서 원융무애한 줄 알면 큰 잘못입니다. 이 경지는
허물도, 법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마음이랄 것도 없습니다. 허물도 변(邊)이고, 법도 변(邊)이며, 나는 것도 변이며, 마음이라 해도
변입니다. 이 모두가 없으면 중도가 안될래야 안될 수 없습니다.
26)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能隨境滅하고 境逐能沈하야
(능수경멸) (경축능침)
능(能)은 주관을, 경(境)은 객관을 말합니다. 주관은 객관에 따라 없어져 버리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이 남아 있으면 모두가 병통이라는 말입니다.
27)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境由能境이요 能由境能이니
(경유능경) (능유경능)
객관은 주관 때문에, 주관은 객관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성립하지 못하고 객관이 없으면 주관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병이므로 주관ㆍ객관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28) 양단을 알고저 할진댄 원래 하나의 공이니라. 欲知兩段인댄 元是一空이라
(욕지양단) (원시일공)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두 가지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 전체가 한가지로 공(空)하였음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관도 객관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근본 대도인데, 주관ㆍ객관을 따라 간다면 모두가 생멸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를 버려야만 대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양단이 모두 병이고 허물이므로 이것을 바로 알면 전체가 다 공했더라는 것입니다. ‘공했다’는 것은 양변을 여읜 동시에 진여가 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했다고 한 그 하나의 공은 말뚝처럼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29)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一空이 同兩하야 齊含萬象하야
(일공) (동양) (제함만상)
앞에서 ‘공했다’고 하여, 아주 텅 비어 아무 것도 없는 줄로 알아서는 크게 어긋나니 이는 단멸의 공(斷空)에 빠져 버립니다.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아서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공이란 차(遮)로서 부정을 말하고 양단과 같다는 것은 조(照)로서 긍정을
말합니다.
‘양단을 버리면 하나의 공이 된다’라는 것은 양단을 부정하는 동시(雙遮)에 양단을 긍정한다(雙照)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을 버리고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바로 둘이라는 것입니다.이처럼 하나의 공이 둘과 동일하게 원융무애하므로 완전히 쌍차쌍조(雙遮雙照)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삼라만상이 하나의 공 가운데 건립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변견을 떠나 자성을 깨치고 중도를 성취하면 쌍차쌍조(雙遮雙照)의 차조동시(遮照同時)가 되어 삼라만상과 항사묘용이 여기에
원만구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空)이라 해서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일체가 원만구족한 것을 공이라 하며
공이 또 공이 아니어서(不空), 일체 삼라만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0)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不見靜粗어니 寧有偏黨가
(불견정추) (영유편당)
앞 구절에서 “하나의 공”이란 공공적적(空空寂寂)하여, 일체의 명상(名相)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으므로 일체 삼라만상 그대로가 중도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중도 아님이 없으므로
사사무애(事事無碍)한 법계연기(法界緣起)의 차별이 벌어지게 되어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이 벌어진다고 하니 어떤 실제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차별이 벌어져 드러났다 하여도 거기에 세밀함과 거칠음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이 곧 공이 아니며, 공 아님이 곧 공이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여전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산이라느니, 물이라는 생각은 산은 높고 물은 푸르다는 등 이러한 견해가 있으면 ‘한가지 공이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