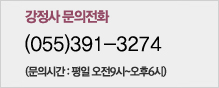한국의 사찰(통도사,흥국사,직지사)
마이템플
0
3364
2008.03.16 13:44
영취산 통도사
1. 인간은 각자에게 있어 거의 비슷한 각도의 시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그에 준한 행동으로 타인과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시야를 넓히려 애써보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조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야가 전방을 향해 있으면 후방은 나름대로
상상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시야에 의해 갇혀진 좁은 세상을 뛰어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초월적 행동은 의지만으로도 할 수 없는 용기와 신념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시야 밖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축적된 복덕이 지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지식들의 존재를 과거로부터 소급해 보는 일이 있다.
그러한 선지식들의 출현은 인류역사의 물줄기를 가름하는 커다란 힘을 표출해 냈던 것이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낮은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 분야에 있어서 첫 장을 열었다는 것은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추앙받게 되는 것이다. 신라시대 산이나 큰 강 하나만 가로막혀도
별개의 세상으로 취급되던 그 시절, 머나먼 이성(異城) 당나라에까지 가서 석가여래의 사리와 친착가사를 모셔다가 금강계단을 세우고 처음으로 불가의
계율을 가르쳐 이 땅에 청정한 승풍의 초석을 다지 자장율사(慈裝律師). 그의 의지가 조개 안의 진주처럼 찬연한 결정체로 남아있는 통도사를
찾았다.
2. 경부고속도를 따라서 한참을 내려오다 경상남도 땅에 이르러 언양을 지나면 곧 통도사 인터체인지가 눈에 들어온다. 오로지 통도사를 찾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관문이며 무수한 발길의 흔적이 느껴지는 곳이다.
통일신라 문무왕때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와 경상남도 창녕 땅을 조금씩 떼어 만든 삽량주가 여러차례 이름을 바꿔오다가 조선 태종때에 이르러
양산이란 이름을 얻은 곳.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과 동해바다를 옆구리에 끼고서 정족산맥의 여맥이 고도를 낮춰가며 자리잡은 양산에 통도사는 자리해
있다.
대가람으로서 필요했을 영산(靈山)의 정기는 양산군의 북쪽 끝 높이 1천 50미터의 영취산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다. 취서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의 사방으로 벋은 줄기 중 남쪽의 한 기슭에 통도사는 자리잡고 앉았다.
당당히 솟아있는 영취산문을 통과하고 나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왼쪽으로 난 길과 통도팔경중
무풍송림(無風松林)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오른쪽 길. 영취산의 정기를 함초롬히 머금고 잘 자란 소나무 숲은 점입할수록 가경이다. 10분쯤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세속에서 묻혀온 온갖 때를 벗겨 통도사의 일주문 앞에 청정한 모습으로 이르게 해준다.
오른쪽으로 통도사 사적비가 보였다. 신라 성덕왕 인평 3년 신갑(丙甲)에 자장율사가 당에 가서 청량산(오대산이라고도 함)의 문수상 전에
7일 정진하고 석존의 비라금점가사(緋羅金點袈裟)와 불정골(佛頂骨), 불지절(佛指節), 불사리(佛舍利), 패엽경(貝葉經) 등을 받아와 인평
13년에 왕과 함께 취서산 아래의 독룡지반(毒龍池畔) 못을 메우고 절을 지어 금강계단을 쌓고 가져온 사리의 3분의 1과 두골 가사를 봉안하게
되었다고 적혀있다.
자장율사는 본래 진한의 진골출신으로 소판벼슬을 지낸 무림의 아들로 태어났다. 늦게까지 후사가 없어 걱정하던 그의 부모가 삼보에 귀의하여
천부관음에게 지극으로 기도하면서 “만일 아들을 낳으면 시주하여 불교계의 지도자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축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 꿈에 별이 떨어져 품안에 들어오더니 이로 인하여 태기가 있었고 석존의 탄생과 같은 날에 자장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선종랑(善宗朗)이라 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자장이 부모의 축원대로 불교의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나게 됐다. 다름 아닌 자신의
탄생을 그토록 염원하던 부모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생의 무상함을 느낀 그는 불법에 귀의를 결심했고 자신이 거처하던 곳마저 원년사(元寧寺)란 절로 고치고 홀로 깊숙한 곳에 살면서
고골관(枯骨觀)을 닦았다. 참으로 혹독하고 열렬한 수행정진을 해나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가자로서의 계율에도 철저했으니, 조정에서 그에게
대신의 자리를 조용하기 위해 여러차례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취임치 않으면 목을 베리라”는 왕의 조칙에도 율사는 “내 차라리 하루라도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파계하고 백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기까지 하다.
이미 그때부터 그는 천인(天人)으로부터 계를 받고 그 계율을 많은 출가자들에게 수계하고 있었던 것이니 그 당시 입산만으로도 승려로서
인정하였던 풍토가 그에 의해 확고한 체계와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선덕영왕 즉위 5년 당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의 수행은 당태종의 위무를 받을 정도였고
선덕여왕 역시 당태종에게 그를 돌려보내 달라고 할 정도였으므로 그가 신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당의 청량산에서 기도 끝에 문수보살로부터 가사와 사리를 얻었을 뿐 아니라 문수보살은 이를 모실 자리 즉 통도사의 위치까지도 선정해
주었다 한다.
온 서라벌의 환영을 받고 귀국한 그는 우선 국찰 분황사에서 대승론과 보살계본을 강술하여 신라불교의 맥박을 뛰게 하였고 그 후로 유학시절
문수보살에게 지시받은 바를 행하기 위해 신라 산야를 헤매다니다 지금의 통도사 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구룡소에 사는 용을 하늘로
승천시키고 못을 메워 “통제만법 도제중생(通諸萬法 度濟衆生)”의 통도사 대가람을 이룩해 놓은 것이다.
통도사의 창건설화를 뒷받침하는 예로 지금도 경내를 돌다보면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땅위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열어보면 1m 쯤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과연 이곳이 못을 메워 이룬 곳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로로 해서 창건을 본 통도사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경내를 둘러보는 마음은 색바랜 고서의 책장을 넘기듯 흥미롭고
평안하다.
3.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조금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가람의 배치는 법당에 준하여 상․중․하 세 지역으로 나누며 이를 상로전(上爐殿,), 중로전(中爐殿,), 하로전(下爐殿,)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로전에는 역시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명부전, 나한전 등의 당우가 속해 있다. 중로전에는 자장율사의 영정을 모신 해장보각과 관음전, 용화전 등의 당우를 갖추고 있고, 하로전에는 일주문부터 시작되어 영산전까지의 만세루와 범종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보광선원은 별개로 취급하여 또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에 이르기 전에 통도사 성보 박물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 아담한 뜰에 금강역사상이 놓여진 이곳의 성보(聖寶)들은
원래 절안의 관음전에 보관했던 것을 만세루의 독립건물에 진열장을 마련하여 전시해오다 다시 이같은 박물관을 건립, 소중히 보관, 전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석가여래의 친착가사를 비롯하여 국내 유일의 오계수호 신장도, 팔금강정(八金剛幀), 구룡병풍, 삼신정(三身幀), 달마도,
감로정(甘露幀) 등을 볼 수 있다.
성보를 전시한 박물관 외에 통도사의 35개의 대소 당우는 그 자체로서 건축, 회화, 조각 등의 역사자료가 되고 있다. 용마루를 한자의
고무래 ‘정(丁)’자 모양으로 짠 대웅전도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물로 보물 144호로 지정되어 있고 용화전, 응진전, 대광명전, 관음전,
약사전, 극락적, 불이문, 천왕문, 영산전, 만세루들도 조선건축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용화전 앞 바리대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봉발탑(奉鉢塔)은 보물 471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통도사와 유관한 역사유물은
통도사에서 약 4km 쯤 떨어진 하북면 백록리에도 있다. 보물 74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유물은 고려 의종 때인 1085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통도사의 영역을 나타낸 비로서 그 이름을 통도사 국장생 석표라 한다.
고려시대 사찰이 소유한 토지가 많았기도 했거니와 절땅을 신성히 여겼던 까닭으로 그 경계를 구분하여 사냥이나 벌목 따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이렇듯 통도사는 돌 하나 풀 한포기까지도 아득한 역사의 숨결을 토해내고 있었다.
4. 당우의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니면서도 통도사의 정수인 금강계단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금강계단은 상로전 중에서도 제일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드디어 다다른 대웅전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았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야 할 자리에 커다란 창이 나 있고 그리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둔 금강계단의 모습이 보였다. 통도사 창건정신이 모두 이 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구룡지의 못을 메우고 그곳에 살던 아홉 마리의 용중에서 여덟마리는 교화하여 승천시키고 한 마리를 남겨 금강계단을 수호케 한
곳.
금강계단은 그 모습에서만도 위엄을 느낄 수 있다. 중생에게는 불법에 대한 귀의처가 되어 주었고 출가자에게는 호법과 지계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다져주었을 금강계단은 1천여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꼼짝않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사천왕상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는 금강계단이지만 왜구의 불사리 약탈로부터 이를 지키려는 통도사 스님들의 끈질긴 투쟁 없이는 불가능한
보전이었다.
고려 우왕 3년(1377) 왜적이 내침하여 불사리를 가져가려함에 월송대사(月松大師)가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금강계단은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였다. 영남지방이 왜구들의 약탈대상지였던 만큼 불사리 또한 약탈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백옥거사(白玉居士)가 왜진(倭陣)에 잡혀있다가 사리를 되찾아 탈출해 와서는 안전히 모실 곳을 위해 사명대사에게 맡기게 되었다.
다시 사명대사는 대소사리함(大小舍利函) 두개를 금강산에 계신 스승 휴정대사에게 보냈다. 그러나 인연법을 잘알고 있는 휴정대사는 “어찌 영남만이
왜적의 침해를 받겠는가. 이곳 금강산도 동해에 있어 안전한 곳이 못되니라.
다만 영축산은 문수보살이 부촉한 곳으로 불행히 여법하지 못한 자가 있으나, 왜구의 마음을 읽어보니 그들이 얻으려는 것은 금주(金珠)요,
사리(舍利)가 아니니 옛날 계단을 수리하여 안치하라.”하였고, 사명은 스승의 영을 받들어 선조 36년(1603)에 이미 황폐된 계단의 옛터를
정리하여 다시 사리를 이곳에 봉안하였던 것이다.
전국의 승니가 모두 이 계단을 통하여 득도하게 되며,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통도사. 승니오부가 학문을 더하게
하고 지계와 범계를 구분, 승려들의 과실을 경계하고 불상과 불경을 엄숙하게 하여 불법태동의 주축을 세운 자장율사의 뜻이 이 시대 불교인들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금강계단에서의 발길은 좀처럼 떨어지질 않았다.
영취산 흥국사
1. 영취산은 기사굴산(耆闍閑崛山)을 번역한 말이다. 인도의 영취산은 중인도 마갈타국 수도인 왕사성 부근에 있는 산이다. 마갈타국의 영취산에는 독수리들이 많이 서식했으며 영취산, 취두(鷲頭), 취봉(鷲峰), 취대(鷲臺)라고도 했다.
이 산에 취영들이 있다고 해서 영취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산정의 모양이 독수리 머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영취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산이 많다. 부처님이 계시면서 법을 밝혀 많은 사람을 제도하는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부르는 산명이다.
여천 흥국사가 앉아 있는 산명도 역시 영취산이다. 지리산으로부터 달려온 한 지류는 진례산(進禮山)과 영취산을 여천에 놓아 흥국사가 앉을
수 있는 지형을 이루었다. 이곳의 지형은 한 송이의 연꽃과 같다. 진례산과 영취산을 중심한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흥국사를 감싸고 꽃잎처럼 둘러
있다. 물길도 역시 자내리골에서 흘러내린 물줄기와 정수암 계곡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마주치는 곳에 흥국사가 자리하고 있다. 풍수가 빼어난 곳이다.
물론 산명은 사람이 붙인 이름이다. 보조국사의 개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곳을 영취산이라고 이름한 사람도 보조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흥국사의 사적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절은 보조국사가 창건했으며, 창건 당시부터 호국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깊었다는
점이다.
사적기에 나타난 연대와 창건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국가의 부흥과 백성의 안위를 기원할 수 있는 경관이 좋은 택지를
찾아 절을 짓기 위하여 성지를 찾아 다녔다. 그러나 굴봉산에 올라 좌선정진하던 중 한 노승이 나타나 국사를 금성대(錦城臺)로 안내한 후 영취산을
바로보며 설명했다.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연꽃과 같은 형국을 이룬 길지에 수림이 장려하고 지세가 맑아 용의 귀처럼 비상한 형국이므로 고승이
주석할 수 있는 대도량이 되리라고 했다.
절묘하고 빼어난 길지에 절을 지어 흥국사라고 하면 불법이 크게 일 것이며, 장차 흥국사가 부흥하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면 절도 또한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국사는 성현의 가르침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흥국사의 터를 이곳에 잡았다.’
고려의 사회적 정신과 무관하지 않는 호국의지를 간직한 흥국사는 창건시부터 그 정신적인 배경이 나라의 부강과 백성들의 안위에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2. 고찰에는 산수를 찾아서 마음을 닦으려고 했던 많은 선인들의 입김이 서려 있다. 산수하원자(山水河原者)들이 돌 하나를 옮겨다 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쌓았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녹아 있다.
아무 것도 아닌 돌 하나 풀 한 포기가 산수의 뿌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진인에 의해서 하나의 뜰에 옮겨지는 순간 그 돌과 풀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응결하여 오염된 정신을 맑게 씻어주는 정교함으로 피어난다. 스승에게서 제자로, 또 그 밑의 제자로 이어지는 인맥에 따라 그
뜰은 더욱 정교한 미감으로 충일되어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뜰의 주인이 이루어 낸 숭고한 정신의 세계로 흘러들게 한다.
한번 뜰의 기반이 구축되면 누구나 함부로 그곳에 들어설수 없도록 하며, 설사 산란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 이르렀더라도 그의 오염된 정신을
세척하여 지고한 정신의 훈향을 느끼도록 한다.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이치를 내다본 이 뜰의 주인들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영롱한 음성으로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이치를 뜰이 지니고 있는 고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
설명이 필요없는 의취(意趣)로, 뜰에 놓인 돌 하나가 아무렇게 그 자리에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기나긴 역사를 말해줄 때도 있고,
인걸의 오고감을 말해줄 때도 있고, 고결한 진인의 성품을 들려주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뜰의 한 옆에 이르러서도, 뜰이 주는 언어가 무슨
의미인지 받아서 간직할 수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어둡고 거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아야 옳다. 그렇기 때문에 정갈한
마음을 갈망하는 산수자들은 언제나 마음이 허허로우면 누대(累代)를 이어오는 조사들의 뜰을 보기 위해서 숲이 무너져내리는 심산유곡으로 발길을
옮겨간다.
크고 작은 산이 머리를 은성하게 맞모으고, 물길 하나와 다른 물길 하나가 손을 맞잡는, 조화와 합일의 영지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그 지향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깊고 깊은 묵상에 잠기고자 한다.
우리가 고찰을 찾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이다. 그냥 장난삼아 고찰의 뜰 앞에 가서 서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찰의 뜰 앞에 서는 것은 유객이 한 점의 풍경화를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닌 것이다.
천년 고찰의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5백년 1천년 전의 노사들의 입김과 정교한 돌 하나를 손에 취어다 이 뜰에 보태기 위해 산하를 뒤지고
다녔을 그 맑고 맑은 정서에 깊이깊이 젖어보고자 함이다. 누대를 두고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그 정서에 거친 이 몸이 닿음으로 해서 정신의
오염이 씻겨 내리고 어두운 머리가 밝게 열려 날로 향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관문을 두드려보고자 함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찰을 찾아 나선다.
그곳에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로부터 오늘의 삶에 조명을 받고, 새로운 역사 앞에 어떻게 내가 서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함에서이다.
3. 여천 흥국사는 보조국사의 창건으로 그 내력이 8백년을 두고 오늘에 이어지는 호남지역의 손꼽히는 대가람이다. 등지고 앉은 산의 형국이나 두줄기 물줄기가 합일을 이루는 모습이 불교의 기본적 사상인 원융의 세계를 그대로 표명하고 있다.
1182년, 그러니까 흥국사에 오기 14년 전인 25세 시에 진제사에서 행하던 담선법회에 참석, 승선에 응하여 승선이 되었던 보조는
선객의 길이 명예와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음을 자각하고 표표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걷는 길을 택했다. 그 뒤 그가 적은 ‘정혜결사문’에 보조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
“이 모임이 끝난 뒤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대중생활 속에서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닦는 데 힘쓰며 예불하고 경 읽고 각각 맡은 바에
충실하며 본래의 성품을 닦아 평생을 활달하게 지내어 선각자의 높은 행을 따르면 어찌 통쾌하지 않으랴.”
이러한 보조의 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흥국사이다. 1190년 봄, 흥국사에 그가 오기 6년 전, 보조는 거조사에 머물면서 옛날
함께 공부의 길을 걷기로 했던 도반을 모았다. 옛날의 도반들은 병들거나 죽거나 명리에 이미 몸을 적신지라 겨우 삼사인에 지나지 않았다. 거조사
시절의 10년 결사중에 지리산의 상무주암으로 옮겨 앉는 연간에 흥국사에 인연이 닿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무주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보조는 자호로써
목우자(牧牛子)라고 쓰기 시작했다.
흥국사는 그 창건배경에 불국토 사상과 비보사찰(裨補寺刹)이라는 맥락을 두르고 있다. 호국토(護國土), 호불법(護佛法), 호민족(護民族)
등의 깊은 뜻이 함축된 호국이라는 말에는 진실이나 성실이나 정직한 생활의지를 바탕으로 한 살기 좋은 땅의 건설에 깊은 의미가 있다. 정법을
지키고 정법을 꽃피움으로 해서 나라와 백성이 부강해지고 바로 살 수 있다는 의취가 더욱 깊다. 그저 막연하게 호국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국토가 밝고 청결한 인간의 정신과 깊은 연대를 갖고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인연국토설은 곧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삶을 현전화시키기 위한 복선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과거의 어떤 현인이 이 땅에 있었던 곳이기에 더욱 그 있음을 뜻을
오늘에 밝게 현양해보자는 의미로도 해석해야 한다.
과거에도 정법이 꽃 피었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도 정법이 피어나게 하여 진실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이룩되어 안녕과 질서 평화가
넘치는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목우자의 의지가 흥국사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더듬어볼 때, 흥국사는 불법이 크게 일어날 도량이라는 점을 들어 불국토설을 주장했으며, 이 절이 잘 되면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면 이 절도 잘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흥국(興國)이 비보(裨補)요 방국(邦國)의 지보(至寶)임을 강조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무신정권의 창궐로 문란해진 사회정의와 무질서에 대해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승가에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승가와 사회가 지향해
가야 할 지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했는데, 흥국사는 바로 보조국사의 이와 같은 사상를 배경으로 창건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깊다.
4. 보조국사는 1196년에서 1201년까지 대략 5년여 기간 흥국사 창건에 주력하다 송광사로 옮기고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수선(修禪)도량으로 삼았다. 그러나 몽고군의 침입으로 병화를 당하여 한 때 폐사되게 된다. 그 후 250여년이 지나 법수(法修)스님에 의해서 다시 가람을 일으키는 인연을 만나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아 다시 전소되는 불행을 겪는다.
30여년간 폐허 속에 있던 흥국사는 계특(戒特)스님에 의해서 다시 중수된다. 1624년부터 계특스님은 복원불사계획을 세우고 법당중건에
나섰다. 요사를 재건하고 전각을 세우고 범종과 불구도 갖추었다.
1639년에 홍교를 축조하고 6년 뒤에는 정문을 건립하여 사찰의 규모를 정비했다. 계특스님은 21년 동안 흥국사 복원에 총력을
쏟았으며, 그 뒤를 이어 그의 제자로 보여지는 통일(通日)스님이 1690년에 대웅전을 중창했다. 계특스님으로부터 무려 66년 동안이나 흥국사의
중창불사가 계속되었다.
흥국사는 1195년 보조국사에 의해 창건, 1560년 법수대사에 의해 중창되었으나 1592년 임란으로 전소되었다. 1624년 계특스님이
법당을 세우고 선원과 요사를 재건했으며 범종을 주조하고 선당(禪堂)도 세웠다. 흥교도 축조했고 정문도 세웠다.
1759년에는 동상실(東上室), 선당(禪堂), 명월요(明月寮), 극락전(極樂殿), 보광전(普光殿)등 무려 31동의 전당이 있었으며
청계암, 연화대, 명적암, 금선암, 내원암, 안초암, 도솔암, 향운암, 영선암, 청운암 등 무려 10개의 암자가 산내에 있었다. 대중이
640여명이었다고 하니 당시의 흥국사가 얼마나 규모가 컸던가는 짐작되는 일이다.
1779년경에까지 300여명의 승군이 흥국사에 주둔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국난에 대비한 당시의 흥국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1803년에도 승군 300여명이 적묵당 중창을 도왔고 1812년에 들어서도 300여명의 승군이 심검당 중건에 손을 썼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줄곧 승군이 흥국사를 외호하며 당우도 짓고 수행도 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전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 경에는 30여명으로 대중의 수가 준 것을 보면 승군이 해체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박명선 주지스님은 퇴락한 당우의 보수와 전각의 개축에 힘을 쓴 결과 경내에는 대웅전, 팔상전, 나한전, 불조전, 무사전, 원통전
등의 전각과 적묵당, 심검당, 백연사, 만월요 등의 당우가 있으며, 누각은 봉황루, 범종각 등이 있고 일주문, 천왕문, 법왕문 등이 있다.
85년에 부임한 명선스님은 대웅전을 해체 복원했으며, 심검당도 해체 복원하여 면모를 일신했다. 또 정묵당, 봉황루, 종각, 범종 등도 원래
모습대로 모두 복원됐으며, 앞으로 노전과 응진전, 팔상전, 원통전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
흥국사는 1630년에서 1780년까지 150여년간에 대중이 700여명이었으며 당우와 암자가 총림의 규모로서 가장 흥했던 점을 알 수
있다.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흥국사를 찾는 것은 우리의 민족사에 한 걸음 다가서서 모든 것을 재조명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밝게 모색하고자
함이다. 날이 어두워져 흥국사를 뒤로 하고 나오면서 흥국의 이념이 다시 그곳에서 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황악산 직지사
1.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쳐가는 제현상, 그 속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장소와 물건 등 무념(無念)의 피사체들도 수많은
인연이란 집합체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간의 겉으로는 의외성을 띤 만남으로 인해 흠칫 놀라기도 하고 한편 기뻐하기도 하며
부정할 수 없는 인연의 끈을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하지만 인연의 지중함이란 감각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가령 무의식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상념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자신으로서는 단 한번의 경험도 없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면 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하게도 인간은 이러한 불가시적인 인연에 더욱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그 심연의 출처를 운명이라 규정짓기도 한다.
하지만 인연의 지중함이란 감각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가령 무의식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상념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자신으로서는 단 한번의 경험도 없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면 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하게도 인간은 이러한 불가시적인 인연에 더욱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그 심연의 출처를 운명이라 규정짓기도 한다.
모든 일회적 만남이 씨앗이 되어 그로 인하여 인과 연의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여 다시금 새 인연을 맺게 되는 철칙 속에서 뉘라서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뉘라서 삶을 무성의하게 살 수 있겠는가. 불가(佛家)에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혜까지도 인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엇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불교 1천6백여년의 역사 속에는 그 시작이 있다. 이 시작 역시 인연의 끈으로 매듭짓지 않고서는 탄생할 수 없는 운명에서
태동되었다. 그러한 인연의 무거리를 더듬어 볼 직지사(直指寺)는 황악산(黃岳山) 아랫자락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장구한 세월을 지켜왔다.
2.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4개 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예부터 우리나라 5대 교역도시의 하나로 발전해온 김천시를 아래로 하고 북으로 15km 지점에 솟아 있는 황악산은 소백산맥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며 경북 금릉과 충북 영동을 구획하고 있다.
일명 황학산(黃鶴山)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은 추풍령의 남쪽을 잇고 있기도 하다.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개가
필요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추풍령, 사람들의 오고감이 많았으니 그 만큼 사연도 많고 애환도 많았으리라. 추풍령의 하늘은 기류가
어지러워 새들도 피해 간다고 한다. 구름까지도 쉬어간다. 이러한 추풍령의장애가 아니더라도 직지사를 찾는 길은 서둘러 갈 길이 아니다. 남들이
모두 꿍꿍거리며 여기저기 자신을 얽어 놓고 바삐 가는 세상이라도 홀로 넉넉함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유를 찾아나선 길인데 굳이 바쁠 이유가
없다.
황악산 정상에는 엊그제 내린 눈이 희끗희끗 남아 있어 먼발치로 위엄있는 기품이 느껴졌다. 차츰 황악산으로 들어서는 느낌은 또 다르다.
외형의 굵직한 선이 흐물흐물 녹아들어 풍성한 산림과 계곡으로 살을 붙인 황악산은 마냥 아늑하기만 하다.
직지사 입구의 너른 터에 이르러 왼쪽으로 오솔길이 굽돌아 나가고 그 입구에 ‘직지사 약수정’이 새겨진 입석이 우뚝 서서 행인을
지켜본다. 한국의 사찰 어느 곳에 이러한 감로수가 없겠는가. 민족의 영산이면 어느 곳이나 자리잡은 사찰을 볼 수 있음이고, 이곳 역시 황악산의
정수(淨水)와 직지사의 음덕이 합하여 맺어진 인연의 선과(善果)다.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 차례 돌풍이 바닥을 휩쓸고 비상했다. 건조한 바람 한 줄기가 땅을 휩쓸고서 내던지듯
떨쳐놓은 스산함, 그 속에는 어린 사명의 입산하는 뒷모습이 어려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나이에 걸맞지 않은 생의 무상함을 느꼈을 사명이 조부의 손에 이끌려 낙동강을 따라 오랫동안 걸어온 피로를 풀
생각도 잊은 채 김천거리를 지나 직지사로 향하는 뒷모습이었다.
풍족하지 못한 삶의 여건 속에서 등 떠밀리듯 의지처를 찾아 떠난 이 길이 민족의 오롯한 정신적 지도자로 커나갈 포석이라고 어린 사명은
상상이라도 했을까? 하지만 그의 의지만은 확고했을게다. 장부로 태어난 한 몫을 하기위한 포부만은 간직하고 있었을게다.
황악산 맑은 계곡물 소리에 여독을 풀고 손과 얼굴을 씻은 그는 그 물에 세속의 인연까지도 씻어버렸고, 직지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직지사의 조실 신묵(信黙) 스님은 공양을 마치고 쏟아지는 졸음으로 잠시 몸을 벽에 기댄 사이에 절 앞 은행나무에서 누런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꾸었다.
너무도 상서로운 이몽에 은행나무 앞으로 나갔다가 조부의 손을 잡고 직지사로 들어오는 13세의 사명을 보았고, 이내 큰 재목감이란걸
감지한 신묵스님은 사명을 기꺼이 맞아 들였다. 그리하여 직지사는 창건 이래 가장 큰 스님으로 모시게 될 사명을 맞아들인 것이다.
밀양에서 태어난 그가 먼길을 걸어 이곳까지 찾아온 그 인연이 지중하고, 또한 초라한 행색의 그를 알아보았던 신묵스님의 혜안이 아닌들
직지사의 사적에는 기록될 수 없는 일이었다. 속가에서 이미맹자를 읽다가 출가할 뜻을 품었던 그였으므로 빠른 속도로 진보하여 18세에 선과에
급제했고, 30세에는 다시 직지사로 돌아와 주지직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인연은 그를 평탄한 수행자의 길만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 나라 불교는 전래 초기부터 호국불교를 표방해
내려왔고 이제 사명이 그 맥을 이을 차례였다. 불살생의 계율은 그만두고라도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아는 그가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었지만 손에 칼을 든다는 것은 자신의 수행에 뒷걸음을 쳐질 커다란 희생의 감수였고 댓가였다.
하지만 그의 공은 후인에게 귀감으로 남아 있고 불가에서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면 누구에게라도 의식의 갈피 속에 그 공덕이 찬연히 빛을
바라고 있음이다.
그리하여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李粹光)은 스님의 공덕을 이렇게 표현하여 놓았던 것이다.
盛世多名將(성세다명장) 성세란 명장도 많았지마는
奇功獨老師(기공독노사) 기이한 공이사 오직 스님이...
舟行魯連海(주행노연해) 魯仲連의 동해를 배타고 지나
舌聘陸生辭(설빙육생사) 陸價의 말솜씰 다뤄 보렸다
變詐夷無厭(변사이무위) 변덕은 왜놈들 타고난 버릇
羈靡事恐包(기미사공포) 어설픈 외교는 위태하리라
要間一長劒(요간일장검) 허리에 비껴찬 긴 칼을 보면
今日愧男兒(금일괴남아) 오늘의 사나이 스스러워라.
奇功獨老師(기공독노사) 기이한 공이사 오직 스님이...
舟行魯連海(주행노연해) 魯仲連의 동해를 배타고 지나
舌聘陸生辭(설빙육생사) 陸價의 말솜씰 다뤄 보렸다
變詐夷無厭(변사이무위) 변덕은 왜놈들 타고난 버릇
羈靡事恐包(기미사공포) 어설픈 외교는 위태하리라
要間一長劒(요간일장검) 허리에 비껴찬 긴 칼을 보면
今日愧男兒(금일괴남아) 오늘의 사나이 스스러워라.
3. 직지사의 역사는 한국 불교의 전래와 맞먹는 연륜을 갖고 있다. 418년(신라 눌지왕2년) 고구려의 중 묵호자가 지었다고도 하고 468년(눌지왕 52년)에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지었다고도 전한다.후대의 역사가들이 묵호자와 아도화상을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 설은 연대의 오기(誤記)로 인한 착오로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삼국유사의 기록된 바에 의하면 묵호자는 위나라사람 아굴마(我崛摩)와 고구려 여인 고도녕(高道寧)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이 땅에
불교를 처음으로 소개한 데는 그의 어머니 고도녕의 힘이 많이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도의 나이 여섯 살이 되자 출가를 시켰고 16세에 위나라에 보내 불법을 익히도록 했으며 19세가 되어 고구려로 돌아온 아들 아도에게
“고구려는 아직 불법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3천여달이 지나면 계림에서 성왕이 나서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며, 그 나라 서울 안에 일곱 곳의
가람터가 있게 될 것이다.
그 곳이 모두 불전(佛前) 때의 가람터이니 너는 그곳으로 가서 대교(大敎)를 전파하라”고 일러주었다. 그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계림의
땅을 밟았지만 토속신앙과의 괴리로 인하여 핍박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잠시 모례라는 이의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추왕 3년 성국공주(成國公主)가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계림에는 공주의 병을 고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에 아도가 향을
피우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원, 공주의 병을 낳게 해주었고 왕은 답례로서 그에게 소원을 물었다. 그는 ‘천경림(天鏡林)에 절을 세워서 크게 불교를
일으켜 국가의 복을 비는 것을 바랄 뿐’이라 하였고, 왕은 이를 허락하여 절을 짓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이 신라 불교전래의 시작이다. 아도화상은 우선 지금의 선산군에 도리사(桃李寺)를 세웠다. 그리고 멀리 황악산 쪽을 바라보다 손으로
지금의 직지사 터를 가리켰다. 좋은 절터가 있음을 손가락으로 암시하였던 것이다. 사명을 직지사라 하였던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直能人心見性成佛)’는 불교의 가르침에 근원하였다.
창건 이래 선덕여왕 14년 자장율사가 중창하고, 경순왕 4년 천묵대사의 중수가 있은 후, 고려 태조 19년에 능여대사(能如大師)가
대대적 불사를 이루어 43동(棟)의 당우(堂宇)와 산내에 약 26개의 부속암자를 거느린 직지사는 명실상부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
4. 직지사의 경내는 단아한 모습의 당우보다도 여백이 더 아름답다. 무위(無爲)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아는 이의 멋이 배어 있고 조화로움이 무엇인줄 아는 이의 넉넉함이 체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당우 사이사이로 물이 흐르도록 해놓은 정원시설은 자칫 단조로와 보이는 직지사경내의 백미(白眉) 역할을 하고 있다.
일주문과 천왕문 만세루 등의 건축이 조선시대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웅전 앞 3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물 제60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석탑은 본래 문경군 소재 도천사(道川寺)에 있던 것인데 직지사에 탑이 없어 1974년에 이전한 것이라 한다. 이외에도 대웅전
삼존불과 후불탱화 역시 보물 67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긴 세월 발전과 퇴락을 거듭해 나온 직지사가 근세에 다시금 발전이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는 힘은 이 곳에 주석했던 많은 스님들의 공덕에
의해서이다. 6․25시절 영천(靈泉)이란 스님 한 분이 직지사에 머물고 있었다. 때는 전쟁과 피난으로 인해 고아가 많이 생겨났던 시절이다.
스님은 직지사 주위로 피난 온 아이들을 모아다가 넉넉치못한 절 살림 속에서 이들을 거두어 보살폈던 것이다.
이러한 공덕은 사명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생겨날 인연의 씨앗을 뿌린 것이기도 하고 말없는 보살도의 실천이기도 했다. 현재의 직지사는
전 총무원장 오록원스님을 모시고 그 면모를 일신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중앙연수원의 설립과 같은 불사를 진행, 불교대중화로의 큰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 직지사는 천여년 세월의 연륜답지 않게 새롭고 힘차다. 겨울이 아니고서는 따뜻한 태양의 고마움을 느낄 수 없듯이 직지사의 오늘을 느끼기
위해서는 직접 가볼
일이다.